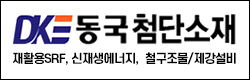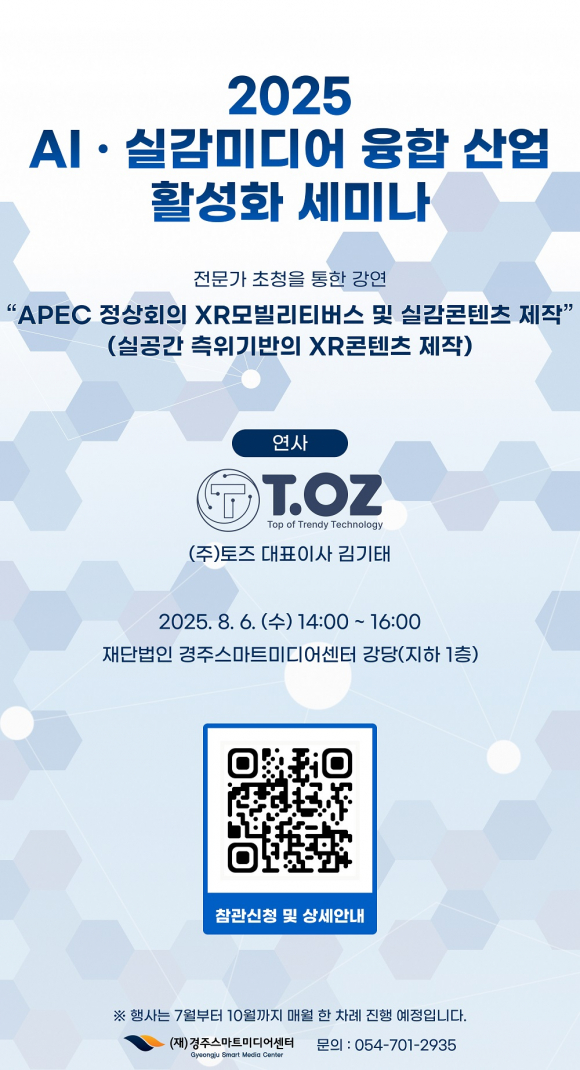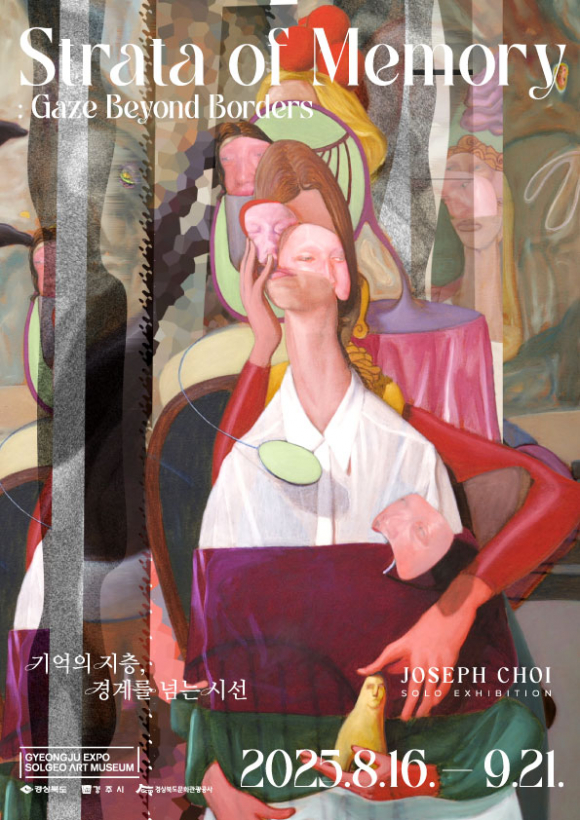|
|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8-17 오전 06:38:45 |
|
|
|

|
|
"국난 속에 빛난 선비정신"주제로 2014 한국학 학술대회 열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06월 08일 입력 : 2014년 06월 08일
 |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특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은 여러모로 곱씹어 보아야 할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당시 안동 무실에서 의병으로 나섰던 기봉(岐峯) 류복기(柳復起) 선생을 비롯한 7부자 및 형제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기봉은 당시 관리도 아니었고, 무예를 닦은 사람도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국난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나,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동생과 아들들을 독려해서 주저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다. “전투 경험도 없는 우리들이 맨 주먹으로 분을 내어 무슨 소용이리요마는, 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성패강약을 헤아릴 일이 아니다”는 기봉선생의 말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조선 지식인들에게 없었던 일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는 우리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비는 국가의 원기>
조선시대 500여년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 되풀이해서 나오는 말이 있다. ‘사림(士林)’ 혹은 사림의 공적 여론인 ‘공론(公論)’은 국가의 ‘원기(元氣)’라는 말이 그것이다. 원기란 사람 몸과 마음의 근원이 되는 힘이다. 다시 말해 집단으로서의 사림(士林)과 개인으로서의 선비가 조선이 국가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근원적 힘이라는 말이다. 조선은 왕조국가이다. 현실에서 최고 권력자가 왕인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서 왕은 물론이고 왕 주변의 고위 관료도 아닌, 단지 글 읽은 사림과 선비를 국가의 원기라고 상식처럼 말하였다.
그런데, 사림과 선비가 국가의 원기라는 생각은 조선이 건국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 건국 후, 100여년이 훨씬 지나서야 등장나기 시작했다. 조선은 처음부터 성리학을 내세우며 건국된 나라이다. 조선이 건국될 때 사림이나 선비의 개념이 없었다는 말은, 중국에서 전해진 성리학의 개념 속에도 사림이나 선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조선이 키워낸 선비정신>
사림과 선비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100년 쯤 지나자 조선 정부는 차츰 부패했다. 국가의 부패는 지배층의 부패를 뜻한다. 그 부패에 대해 공적(公的) 비판을 가하는 일군(一群)의 지식인들이 나타났다. 그때까지도 그들을 사림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이 가해졌고, 그 결과 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는 큰 희생을 치렀다. 여러 차례 있었던 사화(士禍)가 그것이다. 그런 탄압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오랜 시간 후에야 이들을 국가의 원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선비가 국가의 원기라는 말은 그들의 희생에 대한 명예로운 기림이었다.
조선 선비들이 스스로 만든 정신인 선비정신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에 빛을 발하였다. 국가가 누란(累卵)의 어려움에 처하고, 정부는 정작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선비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바쳤다.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정부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후일의 가시적 보상을 기대한 것은 더욱 아니었다.
<선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 자본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자 원리라는 말이다. 최근에 우리는 국가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맨얼굴을 보았다고들 한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에 벗어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원리에 충실한 결과 나타난 사실이라는 점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인 사적 이익 추구의 발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가 이루어 온 것들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듯이 보인다. 우리나라가 비록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 수십 년 동안 커다란 성취를 했다고 믿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사림과 선비를 오늘날 한국사회에 대응시킨다면 아마도 양심적이고 공정한 지식인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대로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과거의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일까? 사실 조선시대 사림과 선비들이 공동체에 헌신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그를 위한 연구조차 대단히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해명은 물론, 그 사실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진지한 모색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난 커다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가 외치는 사실들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06월 08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22,482 |
|
오늘 방문자 수 : 22,318 |
|
총 방문자 수 : 85,386,394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